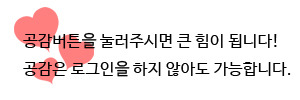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공항을 나온 순간, 인도의 후끈한 열기가 내 몸을 반겼다. 한국에선 패딩을 입고 다녀야 할 정도로 추웠던 날씨인데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더워진 날씨를 마주하니 인도에 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공항철도를 타고 뉴델리역을 나왔을 때의 시간은 저녁 9시 정도였나. 모든 것이 낯선 여행지에 첫 발을 내디기에 그렇게 좋은 시간 대는 아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나와서 뉴델리역 주변까지 가면 육교 같은 곳이 있고 거기로 올라가서 끝까지 가야 빠하르간즈로 갈 수 있다는 정보를 미리 알아뒀다. 뉴델리역으로 걸어가는 길, 배낭을 메고 모자를 쓴 누가봐도 동양인 여행객인 나에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붙었다. 릭샤를 타고 가지 않겠냐, 빠하르간즈는 위험하다, 숙소는 예약했냐 하면서 나에게 말을 걸었다. 역시 소문대로구나. 나한테 말을 거는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뉴델리역을 향해 걸어갔다. 뉴델리역까지 나에 대한 모든 접근을 무시하고 육교를 찾을 수 있었다. 육교를 쭉 건너서 반대편으로 나왔을 때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감이 안 왔다. 일단 큰 길가로 나가봐야겠다는 생각만 했을 뿐. 그리고 난 충격을 받았다. 거리에는 차와 릭샤 그리고 사람들이 뒤엉켜있었고 릭샤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경적을 울려댔다. 이게 진짜 인도인가.
빠하르간즈에 와우카페에서 환전을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어서 무작정 번화가 같은 곳을 걷기 시작했다. 이 곳이 빠하르간즈인지 아닌지 헷갈렸지만 어쩔 수 없었다. 데이터도 안되는 상황이라 앞만 보고 계속 걸어갔다. 릭샤들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여기서 잘못하다간 릭샤에 치일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멀리서 와우카페의 간판이 보이기 시작했다. 얼른 환전을 하고 와이파이로 갈만한 숙소를 찾아봤다. 비행기에서 부터 고생을 하고 있자니 얼른 짐을 풀고 쉬고만 싶었다. 싱글룸 1박에 750루피. 뭔가 바가지를 쓴 것만 같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 속에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인도에서의 첫번째 아침을 맞이한다. 원래 이 날은 뉴델리를 구경하지 않고 바로 바라나시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 Cleartrip을 통해서 기차를 예매했는데 웨이팅이 걸려있었고 난 그 기차표가 빠지길 기다리고 있었다. 기차 시간은 오후 3시. 좌석 확정이 기차 시간 3시간 전에나 된다고 해서 12시까지는 꼼짝 없이 기다려야 했다. 그래서 난 그 전까지 빠하르간즈 구경을 하려고 했다. 밤에는 릭샤들이 무서웠는데 낮이 되니까 그래도 눈에 잘 보여서인지 꽤 익숙해졌다. 그 다음에 생각이 든 건, 정말 쓰레기가 많구나. 먼지가 엄청 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도 사람들은 거리에 쓰레기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버린다. 그게 당연하고 그것이 인도다.
지도를 보지 않고 무작정 빠하르간즈를 걷기 시작했다. 아마 이 때 까지는 여행지에 대한 경계심이 많아서인지 핸드폰이나 사진기를 주머니 밖으로 잘 꺼내질 않았다. 만약 찍고 싶은 모습이 있으면 거리에 멈춰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핸드폰을 내 손에 꽉 쥐고 사진을 찍었다. 혹시 누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훔쳐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내 머리에 가득했다.
그렇게 아무 생각없이 빠하르간즈를 걷고 있었다. 빠하르간즈에서 뉴델리역 방향이 아닌 메트로가 있는 반대방향으로 걷고 있으니 과일을 파는 사람들이 보였다. 오렌지도 팔고 바나나도 팔고 다양한 과일들을 팔고 있었다. 그 와중에 내 눈에 띈건 과일 쥬스를 파는 아저씨 - 아마 인도에서는 무언가를 파는 아저씨를 왈라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짜이왈라라던가 - 였다.
어떤 인도인 한 명이 석류쥬스를 마시는게 내 눈에 띄었다. 사실 길거리에서 뭘 먹고 싶은 생각이 안들었으나 전 날에 엄청나게 울궈내서 그런가 아무것도 먹지 않았었고, 배도 좀 고프기 시작했다. 가서 '이거 얼마예요?' 하고 물었다. sixteen(16). 이라는 대답이 왔다. 나는 엥? 이게 한 잔에 500원도 안한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16루피를 그에게 줬다. 그러니까 그가 살짝 웃더니 sixty. not sixteen. 이라는 대답을 했고 나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그에게 60루피를 건냈다.
길거리에서 먹은 석류쥬스. 한잔을 마시니까 그가 어떠냐고 물어본다. 조용히 엄지 손가락을 하나 들어주니까 웃음으로 답해준다. 유리컵에 한잔을 담아주면 다 마시고 다시 왈라에게 컵을 주고 가면 되는데, 마시면서 이 컵이 얼마나 위생적으로 관리되는지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소리치고, 경적을 울리고 질서가 없는듯하면서도 사고는 나지 않고. 정말 신기했다. 이렇게 많은 자전거와 오토바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지. 참 보면 볼 수록 신기했다.
어제 비행기에서의 소동을 내 머리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 몸은 기억하고 있나보다. 인도 향신료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다. 안되겠다, 인도에 왔지만 한식당을 가야겠구나. 빠하르간즈에는 한식을 파는 식당이 몇 군데 있다. 와우카페는 전문 한식당은 아니지만 한식을 팔고 내가 묵은 sbinn의 위에는 인도방랑기식당이 있고 더 카페이라는 한식당이 있다. 나는 결국 더 카페에 가기로 결정했다.
더 카페에 들어가니 한국인 사장님이 나를 반겨주셨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다. 안식처에 온 기분이랄까. 메뉴판을 들고 고민을 하는데 오삼불고기가 눈에 띄였다. 그래, 한국인은 밥심이지. 와이파이도 되니 핸드폰 좀 만지작 거리고 있으니 음식이 나온다. 오삼불고기, 정말 눈물나게 맛있었다. 어제 다 토해낸 내 위장은 어디갔는지 정말 한톨도 안 남기고 다 먹었다. 왠지 모르게 내 몸이 정화되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밥을 먹으면서 난 기차표 좌석 확정이 나기를 기다렸다. 결국 내 표는 웨이팅 2번에서 빠지질 않았고 내 표는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문구를 보게 되었다. 오늘 바라나시는 갈 수 없구나. 다시 핸드폰으로 예매를 하기에는 안될 것 같아서 뉴델리역에 있는 투어리스트 센터로 가기로 했다. 뉴델리역 2층에 올라가면 여행자들을 위한 예매처가 따로 있다.
일단 올라가서 번호표를 뽑고 가만히 기다려야했다. 미리 양식에 맞춰서 어디로 갈지 내 개인정보들은 어떻게 되는지 써야했고 내 차례가 올 때 까지 소파에 앉아있어야 했다. 더군다나 핸드폰 인터넷도 안되는 상황. 날씨도 후덥지근 했다. 물론 인도에서 에어컨까지 바라는건 아니지만 벽면에 걸려있으면서도 제대로 돌아가는게 하나도 없었다. 정말 가만히 앉아서 여기저기서 온 여행객들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2시간 정도를 기다렸을까. 드디어 내 차례가 왔고, 나는 바라나시로 가는 기차를 원한다. 내일 출발하는 열차면 된다고 했고 나는 다음날 저녁 8시에 뉴델리역에서 출발하는 기차 티켓을 예매할 수 있었다.
예매를 끝내고 나와서 어디로 갈까 고민을 많이 했다. 메트로를 타고 멀리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애매했고 코넛 플레이스까지 걸어가보기로 했다. 코넛 플레이스까지 걸어가는데 길거리에 사람들이 무리 지어 있으면 괜스레 신경이 쓰였다. 내가 지나가는데 해코지를 하는건 아닌지 별에 별 생각을 하면서 그들 옆을 지나갔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다. 코넛 플레이스는 서울로 치면 강남 같은 곳이다. 다양한 프렌차이즈나 명품샵들이 들어와있고 인도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곳이었다.
코넛플레이스를 구경하다보니 스타벅스가 보였다. 한국에서도 스타벅스는 잘 가지 않는 나였지만 왠지 모르게 들어가보고 싶었다. 그냥 쉬고 싶었다. 다른 여행지였으면 길거리에 앉아서 쉬었을텐데 계속해서 나한테 달라붙는 인도인들이 귀찮았다. 그래서 카페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인도의 평균적인 물가를 생각하면 스타벅스의 음료는 비싼 편이지만 시원한 음료가 먹고 싶었던 나는 한국에서도 자주 마시는 아이스모카를 한잔 시켰다. 그렇게 스타벅스에서 한참을 쉬다가 밖에 나오니 벌써 하늘이 어둑어둑 해지기 시작했다.
이 때 릭샤를 한번 타볼까 고민을 했지만 바가지를 쓰는건 싫어서 빠하르간즈까지 걸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걸어왔던 길인 뉴델리역 방향으로 걸어가도 됐었는데, 다른 길로 걸어가보고 싶었다. 코넛플레이스를 빠져 나오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반대쪽 도로에 있는 인도인 한명이 나한테 소리쳤다. "Hey!! Be Careful!" 왜 갑자기 조심하라고 하지? 계속 신경이 쓰였다. 하늘은 까맣게 바뀌고 있는데 길은 차도 옆에 좁은 도로 하나고 이 길을 걷고 있는 외국인은 정말 나 한명 밖에 없었다. 아까 전에 갑자기 나 보고 조심하라고 한 사람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너무 신경이 쓰였지만 계속 갈 길을 걸었다.
점심을 먹은지도 좀 됐고, 저녁이 고팠다. 저녁은 뭘 먹어야하나. 점심에 한식을 먹었을 때 먹성이 돌아온 걸 보면 인도 음식을 다시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도여행 가기전에 산 가이드북을 펼쳐보니 tadka라는 인도음식점이 있었다. 그래서 인도 음식을 한번 도전해보자 하는 생각에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다. 여기서 탈리를 하나 시켰다. 탈리는 여러가지 인도 커리나 밥, 짜파티가 같이 나오는걸 말한다.
그리고 한 숟가락을 뜨는 순간, 다시 어제의 그 냄새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내가 미쳤지. 전 날 비행기에서 그렇게 다 울궈냈으면서 하루 만에 인도 음식이 들어갈거란 생각을 했던건 정말 오산이었다. 결국 난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마음 같아서는 다 버리고 나오고 싶었는데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거 같아서 최대한 먹어보려고 했지만 더 이상 내 몸이 이 강한 향을 견뎌내지 못했다. 결국 나는 반 이상을 그대로 남기고 계산을 하고 나왔다. 바라나시 가는 기차도 못타게 되었고 뉴델리에서 강제로 하룻밤을 더 지내게 되었다. 다른 숙소를 찾아볼까도 했지만 뭔가 귀찮기도 했고 나는 어제 묵었던 똑같은 숙소에 하루를 더 묵었고 인도에서의 온전한 첫 날도 이렇게 끝이 나게 되었다.
'위니의 여행이야기 > 인도,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의 나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멍 때리기만 해도 재밌는 바라나시 갠지스강에서 (0) | 2018.02.22 |
|---|---|
| 너무나도 평범하게 흘러간 바라나시에서의 하루 (0) | 2018.02.17 |
| 바라나시 가는 기차 안, 그리고 갠지스강의 물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0) | 2018.02.12 |
| 의도치 않았던 인도 뉴델리에서의 하루 (0) | 2018.02.10 |
| 생각해본 적 없었던 인도 여행, 시작 (0) | 2018.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