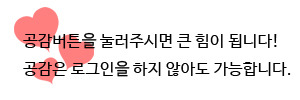사진에서만 봤던 갠지스강을 처음 마주하고 하룻 밤이 지났다. 죠티 페잉 게스트 하우스의 싱글룸의 하루 숙박 비용은 300루피. 한국돈으로는 약 5천원이다. 그렇게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숙소지만 퍽 괜찮게 잘 수 있었다. 생각해보면 빠하르간즈에서 묵은 숙소는 가격은 더 비싸긴 했지만 TV도 있고 개인 방에 샤워실도 딸려있고 꽤 괜찮았던 것 같다. 죠티 페잉에서는 공용으로 쓰는 샤워실이 밖에 있었다.
난 여행을 다닐 때면 꽤나 천천히 일어나는 편이다. 일단 일찍 일어나야 아침 8시 정도고, 보통 9시를 넘겨서 일어나곤 한다. 아침에 일정이 없으면 천천히 일어나는걸 좋아하고 체크아웃이 없는 날에 정말 피곤하기라도 하면 오전 내내 숙소에서 뒹굴거리다가 오후에나 숙소 밖으로 나올 때도 있었다. 이 날은 평소에 비하면 훨씬 더 일찍 일어났다. 철수의 일출 보트를 타기 위해서였다.
철수의 보트는 하루 2번 갠지스강 위에 뜬다. 일출시간에 한번, 그리고 일몰시간에 한번 뜬다.
2월 달, 바라나시의 새벽 공기는 조금 쌀쌀한 편이었다. 해가 뜨기 시작하면 금방 더워지겠지만 나는 후리스를 입고 숙소를 나와야했다. 숙소를 나올 때 숙소 문을 어떻게 여는지 몰라서 조금 당황하고 있었는데 바로 앞에서 주무시던 할아버지가 깨셔서 문을 열어주셨다. 오늘 일출 보트는 나 말고도 다른 한국분들이 꽤나 계셨다.
하나 둘 씩 보트 위에 타고, 철수의 보트는 출발했다. 어제 저녁에는 3명만 타서 조용히 철수의 말에 집중 할 수 있었는데 오늘의 보트는 조금 시끌시끌했다.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의 하루는 철수의 보트를 타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바라나시의 빨래꾼은 아침에 빨래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또 누군가는 그 빨래꾼을 찍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바라나시의 가트를 걸어다니면 갠지스강에서 빨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것이 그들의 직업이다. 만약 당신이 숙소에 빨래 좀 해달라고 맡긴다면 그 빨래는 갠지스강에 맡겨질 것이다.
인도 여행을 오기 전에 한국에서 갠지스강에 대해서 찾아본 적이 있었다. 인도 여행을 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도에 대한 궁금증에 늘어갔다. 갠지스강은 어렸을 때 부터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인도인들에게 중요한 강이라는 점과 한 곳에서는 태어난 아이를 씻기고 한 쪽에서는 장례식을 한다고 알고 있었다. 막상 갠지스강에 오게 되고 느낀 점은 생각보단 깨끗했지만 그래도 더러운 편이고 들어가서 목욕을 한다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여기서 아침마다 목욕을 하고 심지어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 신기했다. 어떤 한국인들은 갠지스강에 들어갔다가 피부병이 났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매일 같이 해서 면역력이 생긴건지 그 비밀이 궁금해졌다.
한 가트에서는 아침 기도를 올리고 있다.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보니 아마 브라만 계급일 것이다. 철수에게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도 물어봤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이미 철폐되었지만 시골 같은 곳을 가면 아직도 그 풍습이 심하게 남아있는 곳도 있고 꼭 그런 곳이 아니더라도 보이지 않는 차별은 존재한다고 한다. 물론 나도 잘 사는 집 꼬맹이인지 교복을 입고 다니던 꼬마애한테 Idiot 소리를 들으며 한번 인종차별을 당한 적이 있었다. 심지어 날 발로 차기도 했는데 정말 열이 받아서 한 대 치고 싶었지만 외국 땅에서 문제가 생기면 온전히 나만 문제가 생기는 거라 웃고 지나갔다. 하지만 심하게 짜증은 나더라. 한동안 그 생각이 났었다.
철수의 일출 보트는 중간에 잠시 가트에 정차를 하는데 이 때 철수가 보트를 탄 사람들에게 짜이를 한 잔씩 대접한다. 다소 쌀쌀한 날씨에 보트 위에서 짜이 한잔을 마시니 온 몸이 녹아내릴 듯한 기분이었다. 인도도 그립지만 짜이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질 때가 있다. 인도에선 인도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영등포에 있는 인도 음식점인 에베레스트에 갔을 때 밥을 다 먹고 짜이를 한잔 마셨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다.
보트를 타면서 철수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갠지스강에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바라나시의 해도 저 멀리서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는데 꽤나 마음에 드는 사진이 찍혔다.
보트를 타고 있는데 옆 보트에서 반가운 얼굴이 보였다. 바라나시 오는 기차에 만났던 체코 할아버지들이 옆 보트에 있었다. 왼쪽에 있는 할아버지가 나랑 눈이 마주치고 인사를 한 뒤에 옆에 친구분을 불러서 날 보라고 했다. 두 분다 반가운 미소로 날 반겨주셨다. 서로의 보트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에 마주한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바라나시 역에서 헤어질 때가 마지막인줄 알았던 여행객들을 우연히 마주하니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이 날, 내가 인도여행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사진 하나가 찍혔다. 바로 "갠지스강의 뱃사공". 내가 이 타이밍을 맞추려고 앞 뒤로 사진을 한장씩 더 찍었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타이밍은 딱 한번 나왔다. 이 모습이 너무 괜찮아보여서 움직이는 보트 위에서 급하게 셔터를 눌렀는데 어떻게 보면 참 운이 좋았던 사진이었다.
일출 시간의 보트는 일몰 시간과 같이 1시간 반 정도를 갠지스강 위에 있다가 보트를 탔던 Pandey Ghat, 판데이 가트로 돌아오게 된다. 일출보트를 타고 다시 육지를 밟으니 너무 일찍 일어나서 그런가 몸이 피곤했다. 아침을 뭐로 먹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보트를 탄 한국인 한 분이 나에게 왔다. 그 분은 나에게 철수와 같이 버터빵을 먹으러 가겠냐고 물어봤고, 나는 딱히 정해놓은 일정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기로 했다. 버터빵은 갠지스강가를 벗어나 고돌리아로 가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거리를 다니면서 소똥을 피해서 걷기 위해 꽤나 신경을 썼다.
버터빵은 대단한게 아니라 버터를 발라 구워낸 빵이다. 빵을 먹기 편하게 반으로 잘라내서 종이 위에 하나씩 건내주는데 정말 보기와는 다르게 맛있다. 도대체 버터만 발라서 어떻게 이런 맛을 만들어내는지 궁금해질 정도였다. 버터빵과 이곳에서 파는 짜이 한잔을 마시니 간단한 아침으로도 딱이었다. 이 날은 버터빵을 하나만 먹었는데 하나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왠지 더 시키기도 민망해서 그냥 넘겼다. 버터빵 한 개와 짜이 한잔을 마시는데 30루피가 들었으니 500원의 행복이다.
버터빵을 먹고 나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꽤나 피곤했고 다시 숙소에 들어가서 점심을 조금 넘긴 시간까지 잠을 청했다. 일어나니까 딱히 점심 생각이 들지 않았다.
처음에 고돌리아에 내려서 갠지스강가를 따라 Pandey Ghat 까지 걸어가는 길은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 날 아침에 버터빵을 먹으러 나오면서 대충 길을 익혀서 그런지 고돌리아 주변의 시장 골목을 구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심에 일어나 천천히 고돌리아 까지 나왔고 좁은 골목을 들어갔는데 길도 매우 좁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 부딪히기 마련이었고 양 옆에 상점들이 쭉 있어서 인지 나에게 말을 거는 것도 무척 신경이 쓰였다. 골목 중간에 멈춰서 사진을 찍기도 힘들어서 골목 안에서는 사진을 찍지 않고 그저 걷기만 했다. 딱히 목적지는 없었다. 아무 생각 없이 쭉 들어가다가 시원라씨의 표지판이 보였고, 나는 처음으로 라씨를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럽 여행을 다닐 때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숙소 근처 마트에 들려서 다농 요거트를 사고 간단하게 그거로 아침을 떼우는게 내 일상이었다. 나는 한국에서든 여행을 다니면서든 요거트를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인도의 라씨는 요거트와 비슷했다. 만드는 방법 자체는 다르긴 하다만 비슷한 맛과 식감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 날 시원라씨에서 시킨건 Mix Fruit Lassi 였는데 60루피 밖에 안했다. 한국돈으로는 1100원 정도인데 한국에서 요거트에 이 정도 과일을 얹는다고 생각하면 저 가격에는 절대 먹을 수 없다. 인도여행을 하다보면 느끼는거지만 물가가 싸다는게 이곳의 큰 매력 중에 하나이다. 인도 음식의 향에 지쳐있던 나였지만 아침의 버터빵과 이 때의 라씨는 정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먹었다.
시원라씨를 먹고 나선 갠지스 강가를 찾기 위해 골목을 빠져 나왔고, 가트를 따라 걷다가 난 다시 판데이 가트의 계단에 걸터 앉아 멍하니 갠지스강과 이 곳을 걷는 사람들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바라나시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멍 때리기만 해도 하루의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정말 이 날은 너무나도 평범하게 흘러갔다. 난 일몰 보트도 타지 않았고 보트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여행이란게 이래도 되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재미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해는 금방 떨어졌고 바라나시에도 어둠이 드리웠다. 점심을 먹지 않은 이 날은 저녁으로 뒷 골목 어딘가에 있는 보나 카페에서 불고기 정식을 하나 시켜먹었다.
딱히 이곳에 가고 싶어서 간건 아니었고 그냥 아무 생각없이 골목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딱히 먹을 만한 곳도 없어서 들어갔던 것이었다. 혼자 가서 시켜먹었는데 한국인 사장님이 하는 식당이라 그런지 주변에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도 많고 한국인들도 많이 보였지만 나는 그냥 혼자 밥을 먹었다. 혼자 온 한국인 손님이라도 있었으면 말이라도 걸었겠지만 아무도 없더라. 이 날 저녁에 외국인 손님 한명이 사장님께 거스름돈을 받는 과정에서 낡은 지폐를 받았는지 사장님께 '당신 일부러 낡은 지폐를 줬지!' 라며 항의를 했고 여자 사장님은 자기는 절대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외국인이 나가면서 가게의 입간판을 쓰러트리는 등 작은 소란이 있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은 잘 갔던 바라나시의 두 번째 날도 이렇게 끝이났다.
'위니의 여행이야기 > 인도,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의 나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바라나시,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1 (0) | 2018.03.07 |
|---|---|
| 멍 때리기만 해도 재밌는 바라나시 갠지스강에서 (0) | 2018.02.22 |
| 바라나시 가는 기차 안, 그리고 갠지스강의 물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0) | 2018.02.12 |
| 의도치 않았던 인도 뉴델리에서의 하루 (0) | 2018.02.10 |
| 뉴델리에서 맞이한 인도여행의 첫번째 아침 (2) | 2018.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