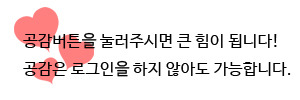사실 필름사진으로 본 인도여행이라는 타이틀보다, 필름사진으로 본 바라나시라는 타이틀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 바라나시를 들어갔을 때는 정말 뭐에 홀린 것 같이 셔터를 막 누르곤 했다.
한국에서 인물사진을 찍다 보면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괜히 사진을 찍었다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 찍어도 되려나? 하는 생각들 말이지.
근데 인도에서는 그런 걱정을 안해도 된다. 카메라를 들고 다니다보면 지나다니는 꼬마애들이 자기를 찍어달라고 포토! 라고 말을 한다. - 물론 다들 그렇다는건 아니다. 하지만 사진 찍히기를 좋아하는 것은 맞다. -
여러모로 바라나시는 내게 사진을 찍기 좋았던 곳이다.
갠지스강에 가면 강가에서 빨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빨래를 하고 강가에 널어두고, 그게 그들의 직업이다.
여기서 만난 한국인 친구가 하는 말이 숙소에다가 빨래를 맡겼는데 갠지스강가에서 그 빨래를 해주는 줄 몰랐다는 후문. 결국에 그 친구는 갠지스강에서 세탁한 옷을 입고 다녔다.
내가 사랑하는 사진 중 하나. 보트도, 사람도, 소도 다같이 함께 갠지스강을 사용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갠지스강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판데이 가트에 있는 레바 게스트 하우스. 이 옆에는 버니 카페가 있는데 그곳에 가는 것도 참 좋아했다.
인도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던 때. 한국 식당은 참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다.
역시나, 내가 가장 좋아했던 판데이 가트. Pandey Ghat에서 멍때리는 것이 내가 바라나시에서 가장 많이 했던 일 중에 하나다.
몇 일 동안 바라나시에 있으면서 나름 정이 많이 붙었던 꼬맹이 친구.
한 동안 내가 앉아있으면 옆에 오더니 내가 스케치 하고 있을 때 와서 이것도 그려달라 저것도 그려달라 했던 기억이 있다.
보트에 올라타더니 보트에 고인 물을 퍼내고 있었다.
바라나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트는 그들의 엄청난 재산 중 하나이다.
보트에 올라타서 바지를 걷고, 조그만한 통으로 천천히 천천히 물을 퍼낸다.
그 모습이 참 이뻐보였는지 렌즈를 이 친구에게서 뗄 수 없었다.
이 녀석의 아버지인지, 삼촌인지 - 하여튼 가족 중 한명이겠지? - 하는 사람이 보트로 왔다.
저런 순수한 미소가 참 이뻐보인다.
보트를 타고 나가는 사람과 보트를 타고 갠지스강을 구경하는 사람들.
갠지스강과 보트는 정말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관계다.
이 때 사진을 보면 렌즈가 살짝 고장나서 희미하게 줄이 생겼는데 이게 퍽 아쉽다. 인도 여행에서 계속 남아있었다.
바라나시, 그들에게 이곳은 어떤 의미일까?
'위니의 여행이야기 > 필름사진으로 보는 인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도] #6 바라나시의 사람들 (0) | 2018.01.13 |
|---|---|
| [인도] #5 철수의 보트를 타고, 두번째 이야기 (0) | 2018.01.12 |
| [인도] #4 철수의 보트를 타고 (0) | 2018.01.11 |
| [인도] #2 갠지스강이 있는 곳, 바라나시에 가다 (0) | 2018.01.10 |
| [인도] #1 인도에 처음 들어서다 (0) | 2018.01.10 |